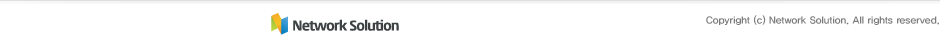|
|
|
|
|
 |
책 제목 : 광장 이후-혐오, 양극화, 세대론을 넘어
광장 이후 』에서 가장 먼저 주목하는 문제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혐오의 정치이다.
광장 이후 』는 혐오와 더불어 오늘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또 다른 핵심 요인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꼽는다.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은 단순히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양극화를 낳는 민주주의의 위기 요인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동안 나는 양극화를 단순히 '경제적 차이'로만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하는 정치적·사회적 균열이었다.
이는 한국 사회가 혐오와 양극화를 넘어설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기도 하다.
결국 양극화 문제는 단순히 경제정책의 영역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사회적 과제임을 새삼 깨달았다.
혐오, 양극화, 세대갈등은 단순히 사회현상의 일부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균열이다.
|
|
|
 |
광장 이후 : 혐오, 양극화, 세대론을 넘어 』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한다.
광장 이후 』에서 가장 먼저 주목하는 문제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혐오의 정치이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는 소득, 자산, 교육, 주거, 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한다.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며 한국 사회에서 양극화가 단순히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했다.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은 단순히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양극화를 낳는 민주주의의 위기 요인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언론과 정치담론에서는 사회문제를 흔히 '청년대기성 세대', 혹은 'MZ세대 대 586세대'와 같은 대립구도로 단순화한다.
세대갈등이라는 단순한 구도로 문제를 설명할 경우, 사회구조적 불평등이나 제도의 문제는 사라지고, 모든 책임이 세대 간의 감정 대립으로 전가된다.
사회문제를 '청년대기성 세대'라는 식으로 바라보면, 복잡한 구조적 문제는 간단히 감춰지고, 갈등은 개인과 세대의 탓으로 돌려진다.
사회문제를 단순히 세대 갈등의 틀로 보는 대신, 세대 내부의 다양성과 교차하는 불평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또한 갈등의 본질을 세대 차이가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으로 이해해야 한다.
청년세대와 기성세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세대 내부에서 누가 더 큰 불평등과 차별을 겪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함께 해결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야 한다.
세대론을 넘어서는 시각이란, 결국 사회 전체의 구조적 불평등을 함께 직시하고, 세대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결국 『광장 이후 』가 제안하는 새로운 시각은, 민주주의가 세대 간의 대립구도 속에서가 아니라 세대를 초월한 연대와 협력 속에서 더 튼튼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로 귀결된다.
결국 이 책이 나에게 남긴 가장 큰 메시지는 민주주의는 광장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 역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시민으로서, 일상에서 차이를 존중하고 혐오에 침묵하지 않으며, 불평등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를 가져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광장 이후 』는 민주주의를 거창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삶의 문화와 습관으로 만들어가야 할 과제임을 일깨운 책이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그리고 광장에서의 연대를 어떻게 생활 속 연대로 이어갈 것인지 스스로 질문하며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한다. |
 |
민주주의, 사회, 혐오, 문제, 세대, 양극화, 정치, 단순하다, 광장, 속, 갈등, 불평등, 일상, 만들다, 책, 연대, 시민, 제도, 이다, 한국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