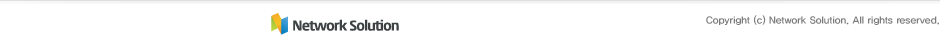|
|
|
|
|
 |
경제적으로 중간 수준을 파악할 때 자산기준 소득 기준 중 어느 기준이 더 효율적일까
4자산 기준과 소득기준의 비교
자산기준은 '장기적 경제력'을, 소득기준은 '현재 생활수준'을 드러낸다.
나는 경제적으로 중간 수준을 파악할 때 자산기준과 소득기준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본다.
경제적으로 중간 수준을 파악할 때 자산기준과 소득기준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자산기준은 장기적인 안정성과 불평등 구조를 보여주고, 소득기준은 현재의 생활수준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
|
|
 |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부동산이 자산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세대간 자산 불평등 문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따라서 자산을 기준으로 한 계층 구분은 실제 생활안정성을 잘 반영한다.
또한 자산이 많더라도 유동성이 낮아 당장의 생활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가령 부동산을 보유했지만 현금화하기 어려운 경우, 실제 생활은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소득이 높지만 부채가 많은 경우, 실제 생활은 불안정한데도 단순 소득기준으로는 상위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
자산기준은 세습적 불평등 구조를 드러내는 데 강점이 있고, 소득기준은 단기적인 빈곤이나 생활곤란을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한 은퇴가구는 소득기준으로는 하위층이지만 자산기준으로는 상위층이다.
반대로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직장인은 월급이 높아 소득기준으로는 상위층에 속하지만, 자산 축적이 부족해 실제 생활안정성은 중간 수준에 머문다.
따라서 자산기준으로는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한 가구가 상위계층에 속하지만, 소득은 평균 이하인 경우도 많다.
반대로 청년층은 소득은 높지만 주택구매가 어려워 자산 축적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일본은 고령층이 많아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가구가 많아, 자산기준 통계도 병행해 사용한다.
한국은 일본과 유사하게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고 고령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기준을 중시할 필요가 크다.
그 이유는 한국의 경제구조가 자산, 특히 부동산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산층을 정의할 때 자산 기준을 활용하면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더 정확히 드러낼 수 있다. |
 |
기준, 자산, 소득, 층, 생활, 많다, 파악, 구조, 가구, 경우, 불평등, 경제, 사회, 수준, 계층, 부동산, 안정, 높다, 정책, 데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