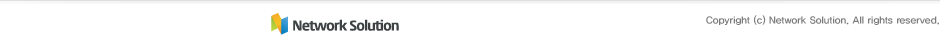|
|
|
|
|
 |
서론-사회 속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독서의 의미
한국사회 속 우생학적사고의 잔존과 현대적 문제
저자는 '우생학'이라는 단어가 가진 불편한 역사 속에서, 인간이 '적격'과 '부적격'으로 나뉘는 기준이 얼마나 모호하면서도 강력하게 사회를 지배해왔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의 우생학이 단지 역사 속에 머물지 않고, 여전히 '능력주의'라는 이름으로 사회에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실의 사회는 여전히 성적, 외모, 경제력, 출신 배경에 따라 인간을 평가하고 차별한다.
|
|
|
 |
한국사회 속 우생학적사고의 잔존과 현대적 문제
이러한 관점에서 김재형 외 다수가 집필한 『우리안의 우생학적격과 부적격 그 차별과 배제의 역사(2024, 돌베개) 』는 현대 한국사회의 인권 문제와 사회적 불평등의 뿌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저서이다.
저자는 '우생학'이라는 단어가 가진 불편한 역사 속에서, 인간이 '적격'과 '부적격'으로 나뉘는 기준이 얼마나 모호하면서도 강력하게 사회를 지배해왔는지를 보여준다.
19세기 말 유럽에서 시작된 우생학은 20세기 초 미국, 일본을 거쳐 한국에 도 전파되었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 빈민, 여성, 한센인 등 사회적 약자가 '비정상'으로 낙인찍히는 근거가 되었다.
저자는 특히 일제강점기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에서 우생학적 사고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내면화되었는지를 세밀하게 추적한다.
과학의 이름으로 행해진 차별이 실은 사회적 통제의 수단이었다는 점을 밝히며, '우리 안의 우생학'이라는 제목처럼, 그 차별의 논리가 여전히 오늘의 사회 속에서도 작동하고 있음을 경고한다.
이는 생물학의 외피를 쓴 사회정치적 이데올로기였다.
즉,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인가'를 결정하는 힘은 사회의 주류 집단에게 있었고, 이는 곧 권력의 문제였다.
이러한 구분은 단순히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사고 속에도 깊게 뿌리내려 있다.
이는 생명을 생물학적 우열로 평가하는 사고를 재생산한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의 우생학이 단지 역사 속에 머물지 않고, 여전히 '능력주의'라는 이름으로 사회에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실의 사회는 여전히 성적, 외모, 경제력, 출신 배경에 따라 인간을 평가하고 차별한다. |
 |
사회, 인간, 우생학, 되어다, 차별, 속, 역사, 이다, 책, 과학, 여전하다, 격, 부적, 배제, 제도, 문제, 구조, 사고, 만들다,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